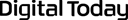![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상장이 올들어 크게 증가했다. [사진: 챗GPT]](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11/602925_559029_5343.png)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개방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신규 상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인시장 선점 경쟁으로 보이나 '부실 상장'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인시장 개방에 앞서 상장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마켓 상장 건수는 총 3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270건) 대비 약 41% 늘어난 수치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가 81건, 빗썸 127건, 코인원 130건이었고 코빗과 고팍스는 각각 31건, 13건의 원화 거래를 신규 지원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거래량 둔화에 따른 단기 전략이자, 내년 예정된 법인시장 개방을 앞둔 시장 선점 경쟁으로 해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인 계좌가 열리기 전까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장 심사 기준은 여전히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다. 각 거래소가 자체 상장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프로젝트 적격성을 판단하지만, 백서 검증·회계감사 여부·유통량 관리 등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때문에 실체가 불분명한 프로젝트나 유통 구조가 불투명한 코인들이 상장된 뒤 논란을 빚는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9월 업비트에 상장된 바운드리스(ZKC)는 급등락 끝에 보름 만에 거래유의로 지정됐으며, 빗썸의 스트라이크(STRIKE)도 7월 거래유의 지정으로 상장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유엑스링크(UXLINK)는 상장 후 보안·유통 이슈로 11월 공동 상폐됐고,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은 연동 토큰 USD1의 유통량 부풀리기 및 특정 지갑 집중 보유 의혹으로 신뢰성 논란을 키웠다.
![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11/602925_559031_5433.jpg)
◆자율에서 공적 규제로...거래소 상장권한 재조정 움직임
상장 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 차원의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지만, 상장 심사보다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와 유의종목 지정 등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업무를 현행 자율규제에서 공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장 및 폐지 기준과 거래정지·해제, 공시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해 상장심사 부실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2단계 법에 현재 자율 규제안인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개정해 반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개별 거래소가 상장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구조를 문제로 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장 규정을 거래소 재량에만 두기보다, 공통 가이드라인(SRO)이나 공적 심사체계를 통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며 "거래소가 공적 인프라적 역할을 겸하는 만큼 이해상충 관리와 규제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법인시장에 적합한 상장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 투자를 유도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발행·유통 투명성과 사업 실체를 발행인(재단)에게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인시장은 개인 투자와 달리 책임 있는 공시와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재단의 자금 운용 구조나 유통 관리, 거버넌스 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장 주체로 책임 소재를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준 증권 수준의 투명성 요건을 적용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ETF 등 상품을 상장하려면 증권거래법에 따른 SEC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시공유·수탁·공시 요건 충족을 전제로 기관 자금 유입을 허용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블랙록, 호주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기관 투자자 겨냥
- 바이낸스, 3개 코인 상장폐지 예고…KDA·FLM·PERP 11월 거래 중단
- 비트와이즈, 솔라나 스테이킹 ETF 뉴욕 증시에 상장
- 미국 첫 라이트코인·HBAR ETF 나온다…카나리캐피털, 나스닥 상장
- OKX, 6개 암호화폐 상장폐지 결정…오는 23일부터 거래 중단
- 창펑 자오 "바이낸스, XRP 상장 폐지한 적 없어"…상장 철학 논쟁
- 코인베이스, 경쟁 거래소 바이낸스'BNB' 토큰 상장 로드맵에 포함
- "코인 상장하면 큰 수익" 10억원 챙긴 일당 줄줄이 징역형
- 암호화폐 시장 자고 나면 '휘청'…비트코인 또 10만달러대
- 스페인 연구소, 13년 만 비트코인 매각…1만달러→1000만달러
- 조란 맘다니, 美 뉴욕 시장 당선…암호화폐 허브 미래는?
- [블록체인핫이슈] 캄보디아 사태·과징금 폭탄...가상자산 거래소 호실적에도 '전전긍긍'
-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북한·러시아 연루 의혹…美 상원의원 조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