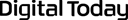![오포 파인드X7[사진: 오포]](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11/602714_558881_3331.png)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중국 스마트폰이 배터리 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반면, 삼성·애플·구글 등 주요 제조사는 배터리 용량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아이폰과 갤럭시의 배터리 용량이 여전히 5000mAh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은 7000mAh를 넘어서는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폰아레나는 "초박형 디자인이 한계라는 분석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규제와 기술적 차이에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운송 규정에 따르면 20Wh(약 5400mAh)를 초과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운송 비용이 급증한다. 반면, 중국 제조사들은 배터리를 두 개로 나눠 규제를 피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개별 셀이 2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게 하면서 총 용량을 늘린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원플러스, 아너, 샤오미 등 다수 중국 브랜드가 적용하고 있다. 반면, 삼성·애플·구글 등은 생산 라인 재설비와 높은 투자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배터리 용량 확대의 또 다른 제약은 배터리 소재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에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중국 업체들은 실리콘·탄소(Silicon‑Carbon) 배터리 기술을 도입했다. 실리콘은 리튬보다 10배 높은 충전 입자를 저장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10배 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실리콘은 에너지 저장 시 부피가 300%까지 팽창해 스마트폰 내부에서 폭발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실리콘 함량을 10~15% 수준으로 낮추고, 코팅·화학 혼합·나노구조 설계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아너는 실리콘·탄소 배터리를 4세대 수준으로 발전시켰으며, 원플러스 15는 실리콘 함량을 15%까지 높였다.
삼성은 과거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건 이후 배터리 기술 도입에 신중하며, 애플 역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만약 실리콘-탄소 배터리가 상용화되더라도 초기 용량 증가는 5~10%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 제조사들은 5년 내 1만mAh 배터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애플과 삼성은 당분간 기존 기술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