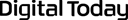![디즈니플러스와 넷플릭스가 K콘텐츠 시장에서 제작비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진: 챗GPT]](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9/595067_552925_1325.png)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내 콘텐츠 시장에 편당 제작비가 600억원을 웃도는 초대작들이 쏟아지고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공격적인 투자가 콘텐츠 경쟁력을 끌어올렸지만, 제작비 인플레이션 심화로 토종 OTT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의 경우 700억원 안팎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디즈니+가 공개한 무빙의 제작비인 600억~65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제작비 상승에는 회당 3억~4억원을 호가하는 톱 배우 출연료와 컴퓨터 그래픽(CG), 세트 등 비용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 역시 대형작들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상반기 화제작인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 로케이션 및 세트제작에 비용이 크게 들어 600억원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넷플릭스 최고 기대작인 오징어게임 2·3는 합산 1000억원 수준의 제작비가 거론된다. 글로벌 가입자 기반을 앞세운 넷플릭스의 공격적 투자가 한국 드라마 시장의 상한선을 다시 쓰고 있다는 평가다.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북극성의 전지현 배우 [사진: 디즈니플러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9/595067_552929_169.jpg)
◆제작 생태계 전반에 부담
제작비 인플레이션은 배우 출연료뿐 아니라 스태프 인건비, 세트·VFX 단가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톱 배우 몇 명만 섭외해도 제작비 절반 가까이가 소진되는 상황"이라며 "중소 제작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OTT에 납품하지 않으면 대작 제작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의 편당 제작단가는 2013년 평균 3억7000만원에서 2024년 4~5배, 많게는 10배까지 뛰었다. 보고서는 "글로벌 OTT는 세계 시장을 기반으로 공격적 투자가 가능하지만, 국내 OTT는 국내 가입자에 의존해 투자 회수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왼)과 웨이브(오) [사진: 각 사]](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9/595067_552928_157.png)
◆토종 OTT, 중저가 IP·스포츠 '생존 전략'
실제 국내외 플랫폼 간 제작 투자 격차는 100배에 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티빙의 콘텐츠 사용원가는 약 2481억원으로, 넷플릭스(162억 달러·약 22조 원)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웨이브 역시 2023년 콘텐츠 원가가 2111억 원에 그쳤고, 쿠팡플레이는 일부 오리지널에 회당 10억원 안팎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격차 속에 토종 플랫폼들은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웨이브는 출범 당시 '5년 1조원 투자'를 선언한 것이 무색하게, 적자 누적으로 제작 대신 기존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티빙은 무빙, 이브 등 일부 흥행작을 냈지만 현재는 CJ ENM·JTBC·스튜디오드래곤 등과의 연합을 통해 판권 확보와 배급에 집중하고 있다. 쿠팡플레이 역시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성과가 미비하자 프리미어리그·UFC 등 스포츠 중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대형 제작비 시대가 본격화된 만큼 국내 OTT들의 구조적 한계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지은 스튜디오T 대표는 "글로벌 OTT는 광고·머천다이즈·극장 개봉 등 다양한 수익 경로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토종 OTT는 국내 구독료 외엔 대안이 마땅치 않다"며 "합종연횡이나 스포츠·광고 연계 모델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스트리밍이 만든 흥행 돌풍…'귀멸의 칼날' 글로벌 신화
- '슈퍼 멤버십' 네이버, 넷플릭스·컬리·우버 품고 일상 침투 가속화
- 드라마보다 축구? OTT, '구독 방패' 스포츠 중계에 사활
-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안, 과방위서 與주도 통과
- 티빙, 국내 OTT 최초로 '오픈AI 챗GPT 엔터프라이즈' 도입
- OTT 품은 플랫폼 멤버십...뭐가 더 유리할까?
- 넷플릭스 독주 막을 국산 OTT 탄생할까?
- 디즈니, 캐릭터AI에 경고장…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
- 방미통위, '2025 국제 OTT 포럼'…산업 혁신 전략 모색
- OTT 예능에 꽂힌 K뷰티...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