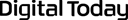![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후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이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412/547330_511600_70.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후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이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중애법인이라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지시에 따라 부동산 시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서 범죄조직에 전달했다.
경찰에 체포돼 기소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에 관련된 것인 줄 몰랐고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며 사기죄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범죄전력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및 폐해가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를 담당한지 며칠 만에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시작하기도 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절차로 채용해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가 아니면 상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오랜 기간 사회 생활을 한 경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금수거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대법원은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현금수거 등을 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죄 가담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환송할 것을 판결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통장을 빌려주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가담한 사람들이 A씨처럼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그런 해명이 통화기 어렵게 됐다.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만으로도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