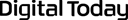![모디 인도 총리(왼쪽에서 세번째)는 대만 파운드리 기업 PSMC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인도에 투자하려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모디 인도 총리 SNS]](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412/544690_508964_5238.png)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도와 베트남, 체코가 새로운 반도체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들 3개국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글로벌 기업 유치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는 기술 인력과 내수시장, 베트남은 원자재와 생산기지 경쟁력, 체코는 제조업 기반과 유럽 시장 접근성이 각각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허브 진입을 노린다.
지난 9월 인도 타타 전자(Tata Electronics)는 대만 파운드리 기업 파워칩반도체제조공사(PSMC)과 인도 최초 AI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장은 2026년부터 월 5만개의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한다. 그 규모는 월 10만개 웨이퍼 제조가 가능한 삼성전자가 운영 중인 오스틴 공장의 절반 수준이다. AI 반도체를 포함해 전력반도체(PMIC), 디스플레이 반도체, 마이크로컨트롤러(MCU)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구자라트에 27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조립·시험·표지·포장(ATMP) 시설을 설립하기로 했다. 2025년 초 가동 예정인 이 시설은 약 5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또 이스라엘 타워반도체는 인도 아다니 그룹과 1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팹 공동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약 7600억 루피(12조 4000억) 규모 인도 반도체 미션(ISM)을 출범시켰으며, 현재까지 5개의 반도체 유닛과 4개의 조립 유닛 설립을 승인했다.
베트남은 더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50년까지 자급자족형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3단계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1단계(2024-2030년)에서는 100개의 설계기업과 1개의 소규모 반도체 칩 제조공장, 10개의 패키징·테스트 공장 설립을 통해 연간 매출 250억 달러 이상, 부가가치율 10-15%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다. 미국 앰코테크놀로지는 지난해 9월 베트남 박닌성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했으며, 2035년까지 총 16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 인텔은 호치민시 사이공하이테크파크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
베트남은 반도체 핵심 소재 광물인 희토류 자원을 강점으로 반도체 기업 유치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22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도 중국의 광물 수출 규제를 대비해 플랜B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고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반도체 핵심 광물 중 하나인 희토류의 제2위 매장 보유 국이다. [사진: 마이닝베트남]](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412/544690_508967_215.png)
체코는 유럽의 새로운 반도체 허브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체코는 지난 10월 국가 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2029년까지 반도체 생산량을 2022년 대비 3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온세미는 올해 6월 약 20억 달러를 투자해 체코에 최첨단 통합 실리콘 카바이드 칩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2027년 생산 개시 예정인 이 공장은 전기차, 태양광패널,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체코의 강점은 높은 제조업 기반과 ICT 인프라다. 코트라에 따르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2% 이상으로 유럽 최고 수준이며, 특히 반도체 품질관리용 전자광학장비는 유럽 전체 생산량의 1/3을 차지한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인 독일 드레스덴과 인접해 있어 협력도 용이하다.
이들 3개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하나마이크론이 6억 달러를 투자해 2개 공장을 운영하며 전체 인력의 70%를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투자액 1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삼성전기는 베트남 타이응옌성 공장에서 지난해부터 FC-BGA(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 기판을 생산 중이다. 체코도 현대자동차의 현지 생산 인프라를 연결고리 삼아 반도체 분야 협력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키워드
#반도체 공급망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美 HBM 수출 규제에 中 광물 통제 보복...韓 산업 '이중고'
-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신설...AI 중심 'C레벨 경영' 전환
- 중국, 美 반도체 제재에 대응…주요 광물 수출 금지
- HBM 수출규제로 미중 AI 전쟁 가속...국내 기업들 영향은?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건설업 생산 6개월 연속↓
- 美, 對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완화 검토…글로벌 반도체 기업 주가↑
- 독일, 자국 반도체 기업에 20억유로 보조금 지원한다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산학연과 원팀으로 AI·반도체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 美 제재 여전하지만 엔비디아 칩 고수하는 中 "고비용·복잡성 발목"
- 인텔 파운드리, 'IEDM 2024'서 AI 특화 반도체 기술 공개
- 삼성 파운드리 "2나노 GAA로 반전 노린다"
- 美 상무부, 마이크론에 반도체 보조금 62억달러 지급 확정
- 삼성전자, AI PC '갤럭시 북5 프로' 한국 첫 공개
- 필리핀,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추진
- 삼성전자, 17일부터 전 사업부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
- 美 바이든, 中 태양광 웨이퍼 관세 2배 인상
- 삼성전자, 8K 프로젝터 분야 세계 최초 표준인증 획득
- 삼성전기, DJSI 16년 연속 편입..."ESG 경영 성과 입증"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정 완료...2026년 착공 속도↑
-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기술로 불황 뚫는다"
- 삼성전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재선정
- IT부품 업계, AI·전장 고부가 전환...실적 상승 기대감↑
- 美 마이크론, 싱가포르서 HBM 공장 건설…70억달러 투입
- [CES 2025]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기회 놓치지 않을 것...부품·소재 기술로 미래 성장 주도"
- 여야, AI 아젠다 경쟁...GPU·소버린AI까지 이슈 선점 본격화
- 하나마이크론, 투자·사업 분리...지주사 전환 추진
- 온세미, 이태종 한국법인 신임 대표 선임
- 하나마이크론, ECTC서 AI 패키징 기술 논문 상위 선정
- 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 계획 전면 철회
- 온세미, 전력손실 50% 감소 버티컬 전력반도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