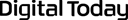![[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7/483060_450695_3659.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거나 대포통장 등을 임대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가담한 사람들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돈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당은 운영하는 지인에게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계좌로 송금할테니 이를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전달된 계좌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입금했다.
A씨는 지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부탁을 했지만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불법적인 일에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6월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자금을 전달한 B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구직광고를 보고 증권사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접촉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거하는 일을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며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서류를 전달하고 사인을 받고 돈을 수거했다. B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고 1심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처음부터 고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개인정보를 받고 돈을 수거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5월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이체를 도운 C씨에 피해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C씨는 대출 소개업소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조직원은 자신들이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C씨는 수천 만원을 입금받아 전달했다. 그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피해자들은 C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걸었고 C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C씨가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만 듣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송금을 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C씨의 과실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D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D씨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법률사무소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받았다. 서류 전달과 의뢰금 회수 업무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보이스피싱이었다.
재판부는 D씨가 5세 아이를 키우는 20대 미혼모로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점과 신분을 감추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D씨가 범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법원에서는 돈 전달, 계좌대여 등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한 사람들이 범행에 동조,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대면으로 돈 받아서 전달하거나 이체 받은 돈을 송금해주는 행위, 계좌 대여 등 보이스피싱을 돕는 것만으로도 공범, 방조죄에 적용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2006년 1488건이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2019년 3만766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으로 감소했다. 최근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건당 피해는 늘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 금액은 2016년 862만원에서 2021년 2500만원, 2022년 2491만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