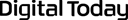![사이버공간에서 해킹 위협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3/438354_421472_4956.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은 해킹 사고 없이 무사히 넘겼지만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 북한 해킹 위헙 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처 및 업무 개편, 사이버사령부 이전 등이 겹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NBC 뉴스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업들에 이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러시아에 부과한 전례 없는 경제적 대가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며 “그것은 러시아의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후 미국, 유럽 등을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자신들에 대한 경제 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사이버공격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 앞서 우크라이나 주요 정부 사이트들이 해킹 공격을 당했다. 우크라이나는 해킹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에는 한국도 동참하고 있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이버공격을 당했는데 공격 배후가 러시아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동향 역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한국 정부는 이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르면 3월~4월 중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북한이 한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이 대해 계속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긴장이 사이버공간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유관기관들은 일제히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이버전 확대, 대러 제재 참여국 대상 사이버보복 우려, 정부 교체기 해킹시도 기승 전망 등 사이버안보 위해 가능성 고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며 21일 오전 9시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국정원이 ‘주의’ 경보를 발령한 것은 2017년 5월 전 세계적으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확산된 후 약 5년만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사이버전 확산, 국내 기업 대상 랜섬웨어, 정보유출 사고 발생 등 사이버위협 발생 가능성이 고조됨에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21일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Ⅳ급에서 Ⅲ급으로 격상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간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반복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보안업계에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사이버위협을 우려했다. 대선후보들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킹 등을 통해 가짜 뉴스가 확산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후보 등에 대한 해킹을 우려했다. 하지만 대선은 특별한 해킹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다시 사이버공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정부 출범이 맞물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부처 개편도 논의할 예정이다. 개편 대상에는 민간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포함돼 있다. 교육과 과학을 통합하는 부처 출범, ICT 부문을 별도 부처로 설립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방부 역시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결정되면 사이버사령부 이전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령부는 다수의 IT장비, 보안장비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정원의 경우는 특별한 조직 개편이나 업무 조정 등의 이슈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정원이 주장해 왔던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시 논의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이 겹치면서 보안 부문 전반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과기정통부, 민간분야 사이버위기 경보 '관심'→'주의' 상향
- 국정원, 공공분야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 발령
- 국정원, IT보안 제품 취약점 해킹 대응체계 마련
- 우크라 사태發 사이버 전쟁 격화...범정부 비상대응체계 강화
- 사이버위협 일상화...국정원 '관심' 경보 유지
- 디도스 등 '사이버 위협' 관심 높은 기업, 보안 공격 감염율 낮아
- 제약바이오 전문가 없는 인수위...'대선 공약' 지켜질까
- 랜섬웨어發 대국민 서비스 마비 위협 고조
- 국정원-4대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
- 사이버안보법 어떻게 되나?...차기 국정원장에 쏠린 눈
- 국정원,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주관 ‘락드쉴즈 2022’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