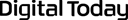![금융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국가 확산금융 위험평가 분석’을 진행했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2/434291_418989_4714.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대량살상무기 등에 금융서비스 유입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 국내 금융환경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대북 무역, 테러단체 송금 등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취약점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조정기구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국가 확산금융 위험평가 분석’을 진행했다.
여기서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020년 각국과 민간 금융회사 등에 확산금융의 위험을 확인,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FATF의 확산금융 관련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의 위험, 취약점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분석을 진행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국내 기업이 잘 준수하고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이번 분석 결과 한국의 금융환경에도 확산금융 관련 여러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분석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러시아 등과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다. 때문에 자금이 이들 국가를 거쳐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 경제의 특성상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 거래를 이용한 위장 거래 등의 위험이 높다”며 “국제적으로 지정된 우려거래자, 미국 등 주요국이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우려거래자 등에 대한 스크리닝이 적절하게 되지 않을 경우 PF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가상자산 환경도 PF에 위험 요인이라고 최종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을 확보, 세탁하고 있는데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이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 금융제재 대상과의 거래 등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오용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금융거래 시 송수신 고객의 신원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100만원 이하의 거래로 한정해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소액 규모의 우려 거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미국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에 대한 스크리닝 등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이 PF 거래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한국도 테러단체와 관련된 PF 위험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2016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활동하다가 2019년, 2020년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한국이 PF 위험의 효과적인 완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관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PF 위험 관련 대응체계는 정부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PF 방지 관계기관 협의회’가
필요시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PF 관련 정보공유가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조정기구를 설립해 PF 위험 및 사안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 확산과 PF를 모두 포함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PF 유형, 위험징후, 대응 모범사례 등 정보에 대해 민간과의 공유가 가능한 채널을 구축해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의 PF 위험평가 및 완화 능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 권고사항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국내외 주요법과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배포, 교육, 안내하고 관련법 제·개정 등 법적, 제도적 보완 조치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