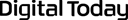[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신용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될 조짐이다. 지난해 연말 대출 규제 강화로 주춤했던 신용대출 증가폭이 새해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신용대출을 재개하면서 아직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금융당국의 대출관리 지침에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전반적인 대출태도를 나타내는 대출태도지수가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차주별 대출태도 지수는 대기업(-3), 중소기업(-6), 가계주택(-6), 가계일반(-1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출 절벽 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하는 등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급증한 고액 신용대출, 특히 긴급생활·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 대출에 대해 은행권의 특별한 관리강화를 당부한다"며 신용대출 자금의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용대출 증가세 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감독원도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당부는 새해 들어 신용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4조101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4534억원 증가한 수치다. 신용대출이 재개된지 4일 만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신용대출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3000선을 돌파하는 등 활황세를 보였다. 한때 3200선까지 치솟던 코스피지수는 13일 오후 2시 기준 3100 중반대로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용대출 재개로 주식시장이 영향이 받았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신용대출 급증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리스크'로 거론된다. 저신용, 저소득층 취약자주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빚이 1700조원에 육박하면서 GDP(국내총생산)을 넘어서기도 했다.
은행권은 당분간은 현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추후 신용대출 증가폭에 따라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최악의 경우 대출중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국이 대출 관련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대출을 재개할 당시만 해도 여력이 있었지만, 수요가 급증한 탓에 대출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분간 가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가계의 경우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은은 주식 등 금융투자 수요 역시 불어나면서 대출 창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추가 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기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영업 중단 업종들은 한계치에 달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신용대출 심사가 강화될 경우 이들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사용용도가 명확한 전세대출과는 성격이 달라 은행이 어디에 자금을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결국 상환이 가능한지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신용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