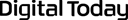![7일 국회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고정훈]](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07/240264_210352_3748.jpg)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의 독점적인 감독체계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독점적 금융감독체제에서 탈피해야지만 효과적인 금융감독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대형 금융사고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패를 반증하고 있다”며 “근본 원인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권은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자산,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환매중단된 펀드금액만 3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으로 나뉘어 운영됐으며 2008년 관치금융의 폐해의 해소를 위해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윤창현 의원은 “키코 사태는 이미 2013년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으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났는데 금융사에게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난해 유죄판결 가능성만으로 은행 임원의 연임에 개입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IMF 이후 단일 감독기구로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현재는 금융사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며 "금융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구조적인 체계를 고칠 때가 됐다"며 "감독당국이 금융기관과 함께 선진금융으로 가는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감독체계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와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양준모 교수는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사후 문제가 되면 불완전 판매로 처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선정 교수는 통합감독 체계와 분리감독 방식의 장단점을 소개하면서 “주요국의 금융감독 형태를 볼 때 어느 모델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용적 비용이 큰 하드시스템 개편보다는 소프트시스템의 수정 보완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융사업자나 금융소비자가 모두 탐욕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면 불완전 판매나 대형금융사고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라며, “감독당국의 제대로 된 역할만이 불상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코로나19 시대 사이버공격 은행 리스크 부상"
- "핀테크 대출 규제 신중해야"...금감원 워싱턴사무소의 경고
- 피해 속출 사모펀드·P2P에 금융당국 전면점검 칼 빼들어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사상 첫 원금 100% 반환 결정
- 금융당국 사모펀드 전수조사 임박했지만...실효성 의문 잇따라
-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OS 개발팀을 직접 꾸린다고?
- 기업용 AI 업체 코스닥 상장 행보 급물살
- 금감원, 미스터리 쇼핑 나선다...펀드 판매·비대면 채널 등 고강도 조사
- "권한 견제 없는 금융위...해체해 분리해야"
- 금융권 압박 나선 국회...제재 법안 봇물 터지나
- 금융당국 '편면적 구속력' 현실화될까?...국회로 쏠린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