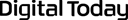![한 시중은행 모바일 계좌이체 화면. [사진:고정훈]](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06/237267_208671_3615.jpg)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잘못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착오송금이 늘고 있다. 비대면 거래 증가와 계좌 송금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생긴 일종의 부작용이다. 간편해진 이체 절차와 달리 착오송금의 경우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워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와 금액이 2017년 9만2749건(2398억원), 2018년 10만6262건(2392억원), 2019년 12만7517건(256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4월까지 5만9723건 발생해 전년(4만964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착오송금의 대표적인 사례는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한 경우다. 실수로 계좌번호 한 두자리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이다. 실수로 금액을 더 보내는 경우도 많다. 온라인에서 한 누리꾼은 “실수로 거래처에 잔금 비용을 100만원 더 보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처에서 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착오송금 금액 반환비율은 2015년 49.0%, 2016년 45.2%, 2017년 53.3%, 2018년 49.8%, 2019년 51.9%으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수취인은 잘못 보내온 돈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법에 있다. 은행은 수취인 동의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요청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없다"며 "돈을 잘못 보낸 고객의 입장이 이해되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요청을 거부할 경우 송금인은 민사 소송 등 법정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다만 이 경우 법정 공방으로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 때문에 송금인은 이체금액이 소액인 경우 반환 의지를 상실하기도 한다. 피해금액보다 더 큰 변호사 비용 때문이다.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명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18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초기 개정안은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송금액 80%를 선지급하고, 이후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받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의 실수를 국가가 나서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계류됐다. 결국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1대 국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내용을 일부 보완해 송금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내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등을 안내하는 방향을 수정됐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개인보다 정부기관이 돈을 반환하기를 요구할 때 회수 효과가 높다”며 "착오송금 관련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해당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착오송금의 구제 방법 등을 묻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네이버 갈무리]](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06/237267_208672_375.jpg)